꽁트-105 소금 기둥
황 영 찬
김 여사가 목사 부인이 된 인숙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얼마 전 길에서 우연히 만난 인숙이가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왔고 또 며칠이 지나서야 김 여사네 집을 다녀갔다.
그때까지도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오랜만에 만난 기쁨 때문에 그리고 알고 싶은 동창생들의 이야기로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런 들뜬 시기가 지나서 그 일이 일어난 셈이다. 물론 인숙은 지금까지도 김 여사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공연히 인숙의 대수롭지 않은 말에 김 여사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날 김 여사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만 구경을 시키는 패물을 인숙이 앞에 꺼내 놓았다. 장롱 속 깊이 간직해오던 보석 상자를 열어 놓고 김 여사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너, 이 보석 이름이나 아니? 얼마짜리인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이만큼 모으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기쁨도 크다고 김 여사는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김 여사는 다른 때처럼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숙이가 크게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도 없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의 탄성도 나오지 않는 입, 김 여사가 얄밉다고 생각하는 그 입으로 인숙은 그녀의 부아를 긁어놓기 시작했다.
“너, 이런 데 정신을 팔다가 아무래도 소금 기둥이 되겠구나!”
“소금 기둥이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할 때 죽은 롯의 처 이야기지. 재물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인숙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성의 멸망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따위 기분 나쁜 이야기는 집어치워라, 얘.”
김 여사는 인숙이의 이야기를 쏘아붙였다. 그러나 이때 상한 기분이 이상하게도 풀리지 않았다. 인숙이가 돌아간 뒤에도 그런 기분은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김 여사는 기분을 전환 시키려고 욕조에 물을 받았다. 옷을 훌훌 벗어 집어던지고 탕 안으로 들어가다가 불현 듯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보았다.
“이 몸이 소금기둥이 된다고?”
그녀는 온 몸이 부르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얼른 탕 안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열기가 온 몸으로 퍼지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샘이 나서, 그런 거야. 저도 여자인걸.”
이렇게 중얼 거리다가 그녀는 손뼉을 마주 쳤다. 그럴듯한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금 기둥이 된다면 나보다 먼저 될 사람이 얼마든지 있음을 인숙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인숙이의 기를 꺾어줘야지. 다시는 소금 기둥 소릴 못하게.”
그녀는 서둘러 목욕을 끝내고 달력부터 쳐다보았다.
“빠를수록 좋지.”
그녀는 친구들을 소집하기로 작정하고 서둘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서, 마침내 그 날이 왔다. 시간이 되자 친구들이 몰려왔다. 그 틈에 인숙이가 끼어 들어왔다. 응접실에서 잠간 이야기를 하다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야, 굉장하게 차렸는걸!”
식탁 앞에 앉으며 모두들 한 마디씩 했다. 그때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자, 김 여사가 한마디 해야지. 환영사가 빠질 수 없지.”
“쑥스럽게 인사는.”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별로 차린 것은 없지만 맛있게 들으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이따가 돌아가실 때 차를 가져오지 않은 분은 저희 집 차를 쓰고요. 그럼 어서들 드세요.”
김 여사는 말을 끝내고 자리에 앉으면서 힐끔 인숙이 쪽을 보았다. 차에 대한 이야기는 인숙에게만 해당된다는 눈길을 보내자 몇 사람이 인숙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재촉을 했다.
“어서들 먹자!”
모두들 수저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인숙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겠다던 김 여사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었다. 식탁 위에서 수저 부딪치는 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얘, 그쪽에 소금 좀 보내라.”
누군가 음식이 싱겁다고 소금을 찾았다. 소금 통이 그쪽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소리쳤다.
“아니 이건, 숫제 소금에 절였군!”
“입도 가지, 가지군. 남은 싱겁다는데.”
“아니, 이건 정말 소금이라니까.”
여기저기서 싱겁다, 짜 네 소리가 나오더니 반찬들이 다 간이 맞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나왔다.
“김 여사가 설탕을 넣는다는 게 소금을 넣은 모양이야. 안 그래?”
누가 김 여사를 동정해서 말을 했다.
“그런 모양인데, 아까운 음식 버려놨잖아.”
어떤 친구는 혀를 끌끌 찼다. 그러자 인숙이가 제안을 했다.
“짠 것은 먹기 어렵지만 싱거운 것은 먹을 수 있으니까 가려놓으면 되잖니. 싱거운 건 소금을 치면 되잖아.”
그래서 짠 음식은 식탁에서 가려내기로 했다. 한 가지 한 가지 요리 접시가 식탁에서 떠나갔다. 그때마다 김 여사는 신음 하듯 중얼거렸다.
“오, 하나님. 소금!”
“오, 하나님. 소금!”
이렇게 김 여사가 열띤 소리로 중얼거리자 누군가 남의 속도 모르고 말했다.
“김 여사가 요즘 인숙이 하고 어울리더니 어느새 신자가 되었나보군. 하나님 소리가 입에 뱄으니.”
그때 김 여사는 깨달았다. 욕실 안에서 완전히 떨쳐버렸다고 여겼던 생각이 아직도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았음을.
“오, 소금! 오, 소금!”
그녀는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열띤 소리로 중얼 거렸다. 결국 몇 가지 남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날 모임은 끝이 났다. 인숙에게 보여주겠다던 김 여사의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되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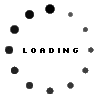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