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트-88 어떤 소문
황 영 찬
벧엘 교회에서 시무하는 김 철순 목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최 성실 목사님을 정하신걸 아시죠?”
“일전에 목사님한테서 애길 들어서 알고 있지.”
나는 대답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궁금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문제라니?”
부흥회 강사에게 문제가 있다면 부흥회 펑크 내는 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 생각부터 떠올리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하면서 말끝을 낮춘다.
“그러면?”
나는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무슨 문제가 있기는 한데 말머리를 꺼내지 못하는 것 같다.
“강사가 못 온다고 한 거야?”
“아닙니다.”
“그러면?”
“최 목사님은 꼭 호텔에 모셔야 한다면서요?”
그는 그게 걱정이라는 듯 물었다.
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를 모시게 되면 숙소로 호텔이나 여관을 정하게 되는데 여관 분위기가 강사를 모시기에게는 좋지 않아 교회 형편에 따라 호텔에 모시든가 교인들 가정에 숙소를 정하는 게 흔한 일이었다.
“뭐, 그러려고? 교회 형편에 맞게 그러시겠지.”
“그런데.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강사로 모셨는데, 혼이 낫다고 하던데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나야 관심도 두지 않던 일이어서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흥밋거리는 되지 못했다.
“그럼, 아예 호텔로 모시지. 그러면 간단하잖아.”
“참, 목사님도. 답답하신 소리만 골라 하시네요.”
“그러면 강사를 오지 말라고 하든가.”
“그럼 부흥회는 어떻게 하고요? 목사님이 도와주세요.”
“호텔 비를 내달라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닐 게다.
“그래 주시든가, 호텔 소리만 나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부흥회 강사가 내 친구란 건 다 알려진 일이어서 그런 부탁을 하는 모양이다.
“그럼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어떤 방법인데요?”
무슨 방법인가 하고 반색을 하는 모양이 보지 않아도 알만했다.
“편지를 하든가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되지.”
“어떻게요?”
“왜 얼마 전에 유명한 부흥강사가 어느 교회 부흥회 때 호텔에서 안수하여 헌금을 거둬갔다는 이야기 있잖아?”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애길 하란 말이야.”
“어떻게요?”
“어떻게는, 그 소문이 퍼져 있어서 교인들 사이에 인식이 안 좋다고, 그래서 불가불 교인 가정에서 강사를 모시기로 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얘길 제가 합니까? 목사님이 해 주시면 딱 인데 요.”
“아니, 혹을 떼어 주는 사람에게 혹을 붙이려고 하는군.”
“목사님 친구시니까. 자연스럽게 말해 주세요. 사실 대로, 호텔에 모실 형편이 안 돼서 걱정을 하더라고 하시든가요.”
“이젠 아주 떠맡기는 군.”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그러면 강사 숙소 문제는 아무소리 나오지 않도록 해줄 테니 나중에 한 턱 내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 목사의 청을 수락한 셈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부흥회가 열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므로 강사에게 연락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 선뜻 대답은 했어도 말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두고 생각키로 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뤘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아예 그 일을 잊어버렸다.
다음에 하겠다고 미룬 것이 잘못이지만 교회에 장례가 있어서 얼마 동안은 숫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내가 정신없이 지나는 동안 벧엘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시작되고, 예정대로 내 친구 최 목사가 강사로 왔다.
부흥회 강사는 어느 집사 댁에 숙소를 정해놓고, 별로 불편 없이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리고 은혜 중에 부흥회를 마쳤다.
내가 생각해도 별 탈 없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묵은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어 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꺼내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일 없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일이 참 이상하게 불거졌다.
김 목사가 난데없이 내게 감사하다고 선물을 가져 온 것이다.
“목사님 덕분에 강사님한테 혼(?)도 나지 않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옳지, 그것 말이군.”
나는 그제야 그 생각을 떠올렸다.
그는 내가 강사에게 말을 잘해주어 무사히 넘긴 모양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부주의 하여 그것에 대해 말할 기회를 놓쳐버렸었다. 그래서 나는 웃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가려고 할 때 내 친구 최 목사를 위해 한 마디쯤 말할 필요를 느꼈다.
“김 목사, 사실은 내가 최 목사한테 그 얘길 못 했었어. 처음에는 미루다가 그랬고 나중에는 아예 잊어버렸거든.”
“정말이세요? 그래도 강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걸요.”
“그러기에 소문도 다 믿을 게 아닌가 봐.”
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으려고 했다. 잘못 하다가는 내가 최 목사에게 말을 하고서 그를 위해 변명하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봐서다.
“모든 게 잘된 셈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안 하신 건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다행이고요.”
“그렇지?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얘길 안 했기 때문이지?”
“그거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후배가 선배 목사님께 대접하는 건데. 그것도 음료수인데요.”
“고마워.”
나는 그의 말에 대꾸를 하면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모두에게 좋게 되었기 때문이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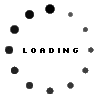
댓글0개